독일의 근무시간
댓글 14조회 12,708추천 7

독일 베를린에서 기차로 1시간30분가량 떨어진 콧부스에 사는 다둥이 아빠 미하일(40)은 퇴근한 뒤에 더 바쁘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베네딕트(5)와 베네딕타(3), 피아노학원이나 실내 클라이밍(인공암벽 등반) 센터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큰딸 막달레나(7)를 데리러 가야 한다. 집에 가선 아이들을 씻기고 저녁밥을 챙겨 먹인다. 식사를 준비하는 일도 그의 몫이다.미하일이 아이들 보육을 전담하는 이유는 매장 관리자로 일하는 아내의 퇴근이 늦기 때문이다. 저녁 8시는 돼야 집에 오는 탓에 아내는 저녁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어렵다. 아내는 한국의 대다수 ‘워킹맘’들과 처지가 비슷하지만, 아이 보육 때문에 경력 단절 위기로 내몰리지 않는다. 에너지 대기업에 다니는 미하일은 오후 5시 퇴근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 노동에 대한 회사와 직원 사이의 신뢰가 있어요. 대개는 오후 5시 전후로 퇴근을 하죠.”

독일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오후 3시를 회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간으로 본다.
하루 8시간만 채우면 ‘핵심 근무시간’ 전후로 출퇴근 시간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 . 그래서 베를린의 퇴근길 러시아워는 오후 4~5시께다. 중소 정보통신(IT) 기업에 다니는 마르코(37)는 “코어 타임만 지키면 윗선에서 초과근로를 요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재미있는 테마를 발견했을 때, 집중하고 싶을 때, 자기성취를 위해 시간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초과근로를 한다”고 했다.늘 일정한 시간에 퇴근하는 아빠 덕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말고 별도의 보육 비용은 들지 않는다. 맞벌이로 부부가 버는 소득은 고스란히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인다. 미하일의 집은 꽤 큰 정원과 차고가 딸린 단독주택이다. “우리 정원에는 가끔 사슴도 놀러와요. 아이들이 좋아하죠.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것은 이런 집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삶의 기준을 유지하려고 맞벌이를 하는 거죠.” 어느 한쪽의 월급 대부분을 보육 비용으로 써야 하는 우리 현실과 달리 미하일네 가족은 ‘삶의 풍요’를 누린다.
독일 맞벌이 가정의 경쟁력은 ‘저녁 있는 삶’에서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2년 조사를 보면, 독일 노동자는 연간 1317시간을 일한다. 한국(2092시간)보다 무려 775시간이 짧다. 1일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독일 노동자들이 한국보다 하루 평균 3시간가량 일을 덜 한다. 이 3시간을 가족에게 쓰는 미하일의 ‘저녁 삶’이 맞벌이 유지의 비결이다. 독일은 40년 전인 1974년에 전체 노동자의 87%가 주당 40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찌감치 하루 8시간 노동이 자리잡은 독일은 한국보다 맞벌이 사회로의 전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독일 노동조합의 최대 관심사는 ‘노동시간’이다. 베를린에서 지난 2월 만난 독일 3대 노조 책임자들은 ‘플렉시블’(flexible·유연한)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했다. 하지만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동자의 고용형태나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는 한국의 ‘유연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다. 독일 통합서비스노조인 베르디(ver.di)의 마르티나 죄닉센 대변인은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에 맞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노동시간 단축 의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 독일 노조가 주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노동자가 자신의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절하는 ‘노동시간 결정권’ 보장을 뜻한다.
베를린 동부 쾨페니크에 있는 인쇄업체 폴리프린트는 1991년에 설립된 회사로 베를린 지역에서는 손꼽히는 ‘강소기업’이다. 지난 2월 오후 이 회사를 찾았을 때 작업 시간인데도 남아있는 직원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혼한 남편과 격주로 5살 아들을 맡아 키우는 ‘싱글맘’ 소냐(36) 역시 퇴근을 앞두고 있었다. 소냐는 하루 6시간 일한다.
“주당 30시간 근무를 해요.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뒤에는 주당 20시간,
아이가 3살 때부터는 주당 30시간 근무를 하고 있죠. 먼저 퇴근한 직원들도 주당 30시간 근무를 하는 엄마들이에요.”

독일의 임금은 주당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급여 삭감 방식도 간단하다.
노동시간을 변경할 때 사업주의 동의나 허가를 받는 절차는 없다. 전자우편으로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게 전부다. 소냐가 다니는 회사 대표인 슈테판 마이너스는 “현실적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할 수 없는데 8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닌 직원들이 가능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동기 부여도 되고 생산성도 최대화된다.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여성들이 일을 더 잘하는데, 8시간 노동을 강제해 일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폴리프린트는 지난해 쾨페니크 자치구가 주는 ‘친가족적 기업상’을 탔다.이처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경쟁력 기준의 하나로 ‘얼마나 가족친화적인지’를 평가한다. 베를린의 12개 구청 중 하나인 쾨페니크구청은 2005년부터 해마다 세계여성의 날(3월8일)에 ‘친가족적 기업상’ 공모를 시작한다. 쾨페니크구청 양성평등부가 자치구 내 200여개 기업들에 △노동자가 원할 때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감축할 수 있는지 △한부모 가정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아빠 휴직을 보장하는지 △아이가 아플 때 병가를 주는지 등의 평가 지표가 담긴 지원 서류를 발송한다. 앙케 아름브루스트 양성평등부장은 “모든 회사가 지원서를 작성해 공모에 응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족친화적 기업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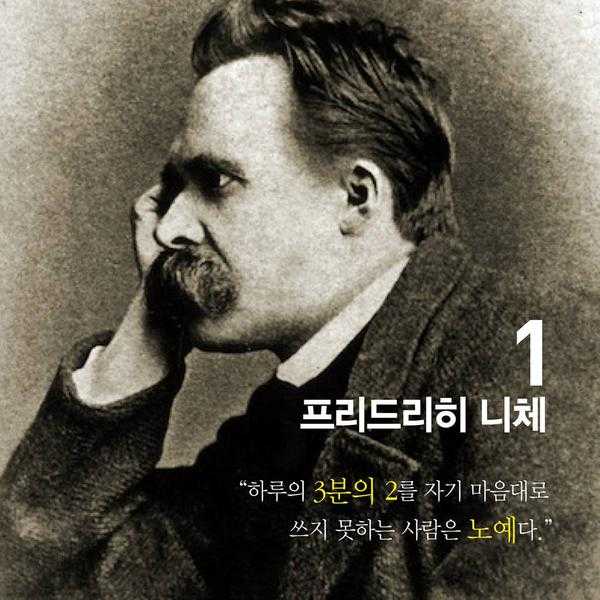
 메밀밭파수꾼의 최근 게시물
메밀밭파수꾼의 최근 게시물
-
[12]전방에 차려포 실시!
-
[21]퇴근길 손흥민
-
[11]사이좋은 포켓몬 히로인들
-
[46]황금손 스님

